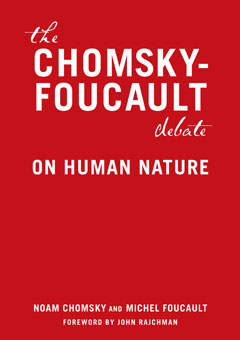
저자: 미셸 푸코, 노엄 촘스키
이 책은 별로 길지도 않은데 지난 몇 주간 붙잡고 읽었다. 내용이 가볍지 않고 여러 개념을 깊이 파고들어서 휙휙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책은 전혀 지루할 틈 없이 흥미진진한 아이디어로 가득했고, 내가 촘스키와 푸코의 관점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
특히, 푸코의 사상이 왜 많은 사회과학자들에게 영향을 줬는지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했는데, 그 예로 푸코는 권력 또는 힘이 관계에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관계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연구 또는 논쟁의 초점을 권력의 합리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비슷한 논점에서 진리(truth) 자체도 권력이라 이야기하는 푸코의 논리에 내가 얼마나 우물 안 개구리의 관점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다. 물론, 연구자로서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공간에 종속되었기 때문에 이를 벗어난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테지만 (게다가 진리 자체도 그러한 테두리에 종속되어 권력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기에 머릿속이 매우 신선해지는 느낌이었다.
촘스키는 푸코보다 훨씬 더 정제된 생각의 흐름을 지니고 있었는데, 나도 언젠가 촘스키처럼 부드럽게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날이 과연 올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의 인터뷰들을 읽었다. 사실 미국인으로서 미국의 타국 정치 개입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유명한 석학의 이야기니 재미가 없을 수가 없다. 전쟁을 강하게 비판한 그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언어학에 관심도 있어 그의 한마디 한마디를 집중해서 읽었다. 책의 첫 장에 나오는 1971년 유럽에서 진행된 두 석학의 대화는 주로 촘스키의 이야기로 가득했는데, 내가 느끼기에 이 두 학자의 관심사나 관점은 일대일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토론이 흘러간 것 같다(물론 토론 사회자와 방송사는 동의를 안 하겠지만). 왜냐하면 촘스키는 푸코보다 덜 추상적인 개념에서 시작을 해서 그의 논리의 초점이 좀 더 구체적인 대상, 이를테면 언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관심사 또한 관계나 사회 문제라기보다는 개별적인 인간에 대한 고찰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내가 느끼기에 푸코는 이 토론 첫 몇 마디 후, 촘스키의 관점이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미국의 시각임을 바로 눈치채고 말수를 줄인 것 같다. 모든 사람은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본성을 타고난다고 가정하는 촘스키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 자체도 우리의 현 시스템에서 구현된 권력이라고 가정하는 푸코의 생각의 출발점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촘스키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성선설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푸코는 인간의 본성에서 벗어나 환경에서 구현되는 경험, 지식, 그리고 권력체계를 이야기한다. 조금 아이러니한 거는 전쟁에 대해 한다 대 안 한다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탈피한 제3의 길이 있음을 오랫동안 주장한 촘스키가 동시에 인간의 본성을 옳고 그름의 이분법으로 구분하고, 푸코가 제3의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는데 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매우 유익하면서도 흥미진지했다. 무엇보다 길지 않은 세미나 강연들을 통해 드러난 푸코의 생각과 논리가 매우 인상적이라 그의 사상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동시에 촘스키의 사상에 대한 한계를 느끼게 하는 책이기도 했는데, 아마 그건 촘스키의 한계라기보다는 촘스키가 살고 있는 시공간의 한계일런지도 모르겠다.
'책이 이어준 생각의 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검은 꽃 (0) | 2021.07.03 |
|---|---|
| 포르투갈의 높은 산 (The High Mountains of Portugal) (0) | 2021.06.20 |
| 논문 잘 쓰는 방법 (0) | 2021.03.02 |
| 세상에서 가장 쉬운 통계학 입문 (0) | 2021.03.02 |
| 앵무새 죽이기 (To kill a Mockingbird) (0) | 2021.01.18 |



